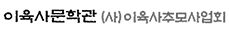수더분한 아름다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
조회
 111
111 - 작성자 관리자
컨텐츠 정보
본문
#곰삭거나 수더분한
우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수반되는 형상도 우아하고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빵을 굽다 보면 몇 군데 균열이 생기는데, 이런 균열은 어떤 의미에서는 빵 굽는 사람이 의도한 바에는 어긋나지만 우리의 주목을 끌어 나름대로 식욕을 돋운다. 무화과는 가장 잘 익었을 때 갈라지고, 농익은 올리브도 썩기 직전에 나름대로 아름답다. 고개 숙인 이삭, 사자의 주름진 이마, 멧돼지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거품 등은 따로 떼어서 보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수반되는 까닭에 그것들을 돋보이게 하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사진출처 : 현대지성
위 문단은 마르쿠스 명상록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바쁜 일상 탓에 의미를 흘려보낸다. 성공한 뒤에 삶과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수반되는 것은 흉할지라도 돋보이기에 아름답다. 그 자체로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름다운 것을 상대적으로 예뻐 보이게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함께 있기에 조화로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건 미(美), 이건 추(醜)라고 규정짓지 말자.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며, 미와 추의 조화가 바람직하다. 세상의 미를 좇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우리는 곰삭거나 수더분한 매력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유동적으로 변한다. ‘변할 가능성’에 제한이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아름답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 반면 지금 아름답지 않은 것은 어떤 현상과 어우러져 숭고한 미를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좇는 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미를 정의할 수도 있다. 다만 추를 억지로 미라고 일컬을 필요는 없다.
#논-피니토로 살아가기
우리 인생은 탐험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모험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짧은 인생에서 철학적 사유를 하거나 나의 실존에 대해 자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하기 힘들다. 험난한 모험 속에서 끝내 자신의 미, 자신 자체를 찾고 나아가는 것은 분명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나는 삶의 주체가 찾아야 하는 '나', 즉 삶의 본질을 미로 정의했다. 미는 모두에게 다르게 존재하고 다르게 실현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아름답다.
어쩌면 아름답다는 말은 꽤나 진부하다. 그렇지만 가치를 포착하는 순간 내 인생의 연출은 내가 된다. 인생을 멋대로 주무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 더불어 뛰어난 미래의 자신을 갈망하곤 한다. 겉멋에 덧붙는 배움에 대한 갈증. 배우고 싶은 갈망과 욕구, 그리고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되고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문득 올려다본 수묵화 같은 저녁 하늘, 청축 키보드를 손가락 빠질 때까지 두드리며 글을 써 보는 것, 스근하게 끓이는 뱅쇼, 채소를 썰 때 나무 도마에 닿는 수분 있는 칼질 소리, 아무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스트레칭하는 몇 분, 내 작은 방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청소하는 몇 시간, 안 들은 지 오래된 노래가 우연히 들리는 순간, 어수선한 책상 위에서 계획을 짜는 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일, 생각 없이 구입한 책이 마음에 쏙 들 때, 덜컹이는 버스 안에서 편지를 적는 일.
나를 내적 파안대소하게 하는 순간들이다. 물론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기쁜 것도 아니다. 저렇게 특정 행동이나 순간을 나열하긴 했지만, 나열된 순간들의 공통점은 ‘우연히 깨달은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저 순간 이후에 기분 좋은 느꺼움이 내게 도달했다는 것이다.
#담박의 세계화
‘담박’이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담박미’란 가식이 없는 참된 맛과 멋을 의미한다. 고려말부터 참됨을 추구하는 사대부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친 꾸밈이 없는 경지를 나타내는 미적용어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멀리즘과도 상통하는 말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정서에는 ‘화려하지만 소박하게, 멋스럽지만 담백하게’가 전제되어 있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은 ‘온새미로’, ‘무위자연’ 등이 있다. 생각해보면 고려청자를 만들 줄 알던 사람들이 조선에 이르러서는 민무늬인 ‘백자’에 환장하게 된 것도 참 신기하다.

최근 <도포자락 휘날리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K-POP, 드라마, 패션,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류 전령사 5인이 펼치는 옴므 방랑 여행기라고 소개된다. 이 예능 방송에 나온 상품들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텀블벅이나 아이디어스 등의 멋스러운 상품들은 ‘담박한 한국미’를 알리기 충분하다.

사진 제공 : MBC <도포자락 휘날리며>
#UNBIRTHDAY
생일도 기념일도, 하다못해 숫자 배열이 예쁜 날도 아닌 보통날은 ‘소소하기에’ 행복하다. 이전에 쓰던 핸드폰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자주 활용했는데, 하루는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답변했다. “당신의 UNBIRTHDAY도 BIRTHDAY 못지않게 축하해요!” 정확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생일이 아닌 날, 그러니까 보통의 날마저 축하하는 인공지능 비서의 답변은 꽤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날의 일기장 한쪽에도 같은 말이 적혔다. 그리고 이 답변이 나온 것도 우연에 의한 것이기에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이후 나는 어떤 날에든 케이크를 먹게 되면 이 말을 되뇌며 오늘을 축하한다. 좋아하는 케이크를 많이 먹게 될수록 축하할 날은 많아지게 된다! 혹은 세상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끔찍한 날에 나를 살살 달래기 위해 그날을 축하하는 의식(?)을 치른다.
말하기에 조금 웃기지만 나의 ‘끔찍한 날이지만 그래도 축하하기’ 의식을 소개하자면, 무지 예쁜 케이크를 먹거나, 시인들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목적지 없이 버스를 타거나, 그날의 하늘 사진을 찍으러 어디론가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방 안에 콕 박혀서 눈이 빠질 때까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대체로 사람 없는 것이 좋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구든 사람이 있을 확률이 0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방 안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겨버리겠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나는 하염없이 비생산적인 일만 하게 되기 때문에 기분은 더 울적해지는 것 같다.
유튜브를 보면 여느 사람들의 브이로그를 구경할 수 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더라도 보통날을 기록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가깝다. 결과물이나 기념일보다도 흘러가는 시간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건 또 색다른 느낌이다. 물론 기념일을 기록하는 사람도 많다. 하고 싶은 말은, 행복을 아무것에서나 아무 날에서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글을 적을 때 무작위로 노래를 재생할 때가 있다. 이 글을 적는 중에 거짓말처럼 재생된, 처음 듣는 이 노래는 아이유의 ‘unlucky’다. 도입부가 ‘기를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냐 하루 정도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로 시작된다. 이런 순간도 보통날이 주는 행복이다. 거짓말처럼 우연이 겹쳐 만들어낸 만족감. 그리고 흘러가는 가사 한 줄이 귀에 박혀 무언가 깨달음을 줄 때 생기는 부드러운 자극감.
내 기억은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좋았든 슬펐든, 행복했든 우울했든. ‘just life we're still good without luck’
■ 권사랑 / 외부청년편집위원

관련자료
-
다음글작성일 2022.05.31
-
이전글작성일 2022.07.26